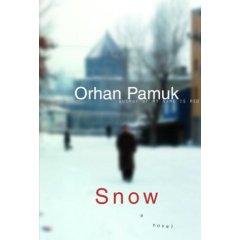
And by the time he was recording these thoughts in the notebooks, Ka was convinced that every life is like a snowflake: individual existences might look identical from afar, but to understand one's own internally mysterious uniqueness one had only to plot the mysteries of one's own snowflake. (Ch 41, p383)
She talked about how beautiful and short life was, and about how, in spite of all their enmities, people had so much in common. Measured against eternity and the greatness of creation, the world in which they lived was narrow. That's why snow drew people together. It was as if snow cast a veil over hatreds, greed and wrath and made everyone feel close to one another. (Ch 13, p113)
Kite Runner를 이틀안에 읽은 것에 비해서 오르한 파묵의 <눈>은 다 읽는데 나흘이 걸렸다. 각 단원이 짧고 주인공 Ka가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와 주위 인물들이 그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분별하며 읽지 않으면 내용이 뒤죽박죽 되어서 이해할 수 정도로 처음에 읽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 6단원까지 읽고 나니까 감이 잡혔다.
오르한 파묵 씨의 책이 읽고 싶었는데 Barnes and Noble에 가니까 My Name is Red, Black Book, Snow, New Life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Snow가 제목이 제일 끌려서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이었다.
독일로 망명했던 시인 Ka는 왜 터키의 Kars에서 소녀들의 자살이 증가하는지를 취재하기 위해 고국을 방문한다. 그 곳에서 사랑했던 여인 Ipek을 만나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또 그 행복함이 영원하지 아닐 거라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리고 터키가 유럽국가임에도 다른 유럽인들과는 접촉이 거의 없어 외국 문화보다는 고유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traditionalists, Islamists가 궁금해 하는 바를 해소해줘야만 하는 압박감도 느낀다. 고국에 돌아오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지만 종교학교를 다니는 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뜻하지 않게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Ka의 고국 방문은 점점 복잡해진다.
이런 혼란 가운데 Kars에는 눈이 자주 내리는데 눈은 마치 그 혼란의 mediator역활을 하는 것만 같다. 눈이라는 감각적 소재에 작가만의 생각을 첨부하여 소설이 다루는 다소 어려운 소재들을 독자가 부담없이 책을 접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눈>을 읽으면서 노벨문학 수상자는 글솜씨뿐만 아니라 소재도 잘 택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파묵의 다른 책들을 어떤지 궁금하게도 했다는.
저번에 뉴욕에 눈이 왔다고 한 번 쓴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내린 눈은 바닥에 쌓일 정도로 왔고 하루종일 멈추기도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눈이 왔다. 눈이 내리는 greenwich village는 또 다른 매력이더라. 나무에 눈이 내려앉아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추운 겨울을 맞서기 위해 따뜻한 코트, 목도리, 모자, 장갑, 부츠/장화로 무장한 미국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이곳 사람들은 모자쓰는 걸 진짜 좋아한다. 야구캡부터 에스키모 모자까지. 나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낄정도로.
난 여름보단 겨울이 좋다. 여름엔 더워지면 옷을 벗어 던지는데도 한계가 있고 겨울엔 계속 껴입으면 되니까. 게다가 소사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 겨울에 일어난 일들이 먼저 떠올라서 말이지. 그리고 겨울에 한국에는 군고구마, 군밤, 붕어빵, 따뜻한 오뎅국물과 떡볶이가 있잖아. 고3 이맘때쯤 보통 귀가기간에 집에 안가고 버티다가 채연양과 소사에서 버스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 역을 향하다가 오뎅파는 아주머니를 보고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고 채연이가 "우리 오뎅먹을까?"하고 물어서 나는 "응!"하고 대답했다. 우리는 말한마디 없이 두 개씩 해치웠고 국물까지 마시는데 정말 그 순간은. 학교를 탈출하여 서울에서 먹는 오뎅이라니!
안타깝게도 뉴욕거리에는 그런 따뜻한 분식류의 vendor이 없다. 5번가에는 군밤파는 곳도 있긴 한데 한국같은 맛이 아니고 이상한 caramelized nuts, hot dogs, pretzel 등 4년내내 바뀌지 않는 메뉴. 결국 겨울맛을 느끼려면 스타벅스에 peppermint mocha나 마셔야 되는 건데 요즘 단게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서 스타벅스 안간지 오래다. 오뎅. 오뎅. 오뎅생각.
그래서 오뎅국물 대신 earl grey tea를 마시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있다. (problem set은 안하고) earl grey tea 가 오뎅국물과 비교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둘 다 따뜻하니까. (illogical reasoning once again)
어 지금 5:55분이다.
아무튼. 겨울이라 좋다. 춥더라도. 캐롤, love actually ost 들으면 포근한 느낌이 들고 교회에 갔을 때 그 따뜻함이 더 잘 느껴진다. 추운 날씨를 살아남기 위해 어그의 중요성도 다시 깨닫고.
